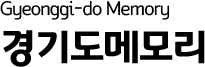이완용(李完用)
출생일: 1858.06.07
사망일: 1926.02.12
행위분야: 중추원
인물경력
- 1867년 4월 당시 예방승지이던 이호준(李鎬俊)의 양자로 입양.
- 1882년 10월 증광별시(增廣別試) 병과(丙科) 18위로 합격, 1886년 3월 규장각 대교(待敎)에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 같은 해 8월 조선 정부가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좌원(左院)에 입학해 수학.
- 1887년 7월 새로 개설된 미국주재 공사관 참찬관에 임명되어 워싱턴에 부임. 1888년 5월에 병으로 귀국했다가 10월 말 다시 참찬관으로 부임한 후 12월부터 1890년 10월까지 대리공사를 역임. 1891년 3월 성균관 대사성, 1892년 9월 이조참판, 1893년 8월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생모 상으로 모든 벼슬에서 물러남.
- 1894년 11월 제2차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성립되면서 외무협판에 임명, 1895년 5월 박정양(朴定陽) 내각에 학부대신으로 입각.
-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주도해 외부대신에 임명되었고, 7월에 열린 독립협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위원장에 선출. 1897년 7월 러시아의 군사교관단 파견을 거부하다가 외부대신에서 학부대신으로 체임. 같은 해 9월 평안남도관찰사에 임명되어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를 겸임.
- 1898년 2월 독립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3월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 독립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 같은 달 전라북도관찰사에 임명, 재임 중이던 1898년 7월 외부대신으로 있을 때 외국에 많은 이권을 넘겨준 일 때문에 독립 협회에서 제명당함.
- 1900년 7월에는 공금유용 혐의로 전라북도관찰사에서 면직.
- 1901년 4월 양부 상으로 관직에서 떠났다가 1904년 11월 궁내부특진관에 임명.
- 1908년 5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에 추대.
친일행적
- 1905년 9월 학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1월에 ‘을사늑약’에 찬성함으로써 박제순(朴齊純 : 외부대신), 권중현(權重顯 : 농상공부대신), 이근택(李根澤 : 군부대신), 이지용(李址鎔 : 내부대신)과 함께 ‘을사5적’으로 지탄을 받음.
- 1907년 5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추천으로 참정대신에 올랐고, 6월에 관제 개편으로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 같은 해 7월 헤이그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황실을 보존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고종의 양위를 상주했고, 궁내부대신 박영효(朴泳孝)가 양위식 집행을 거부하자 18일자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를 맡아 양위식을 집행. 같은 달 24일 대한제국의 입법권•행정권•인사권 등 내정권을 통감에게 넘겨주는 정미조약(한일신협약) 체결을 주도해 임선준(任善準 : 내부대신), 이재곤(李載崐 : 학부대신), 고영희(高永喜 : 탁지부대신), 조중응(趙重應 : 법부대신), 이병무(李秉武 :군부대신), 송병준(宋秉畯 : 농상공부대신)과 함께 ‘정미7적’으로 지탄을 받음. 같은 날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을 공포해 언론통제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 27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공포. 같은 달 31일에는 순종에게서 군대해산에 관한 조칙을 받아내 황실을 호위하는 1개 대대를 제외한 모든 군대를 해산시킴.
이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동화장(旭日桐花章)을 받음.
- 1907년 10월 한국 시찰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를 보조하는 비상설 단체로 조직된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봉영한성부민회 고문에 선임. 같은 해 11월 황태자 태사(太師) 이토를 보좌하는 황태자 소사(少師)에 임명되었고, 12월에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봉해짐.
- 1908년 8월 조선에 대한 자선구제와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진출한 동양협회 취지에 찬성해 찬성금을 기부. 동양협회는 1907년 2월 조선과 타이완(臺灣)의 식민화를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조직. 10월 일본적십자사가 주는 유공장(有功章)을 받음.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을 맡음. 대한산림협회는 일제가 전국의 산림 측량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로 일본인 측량기사를 초빙해 산림사업을 주관.
- 1909년 1월 순종이 남한지역(대구•부산•마산 등)과 서쪽 지역을 순행할 때 통감 이토와 호종. 같은 해 7월 이토의 후임으로 통감이 된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와 함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己酉覺書)’와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에 조인. 10월 하얼빈(哈爾賓)에서 안중근(安重根)의 저격으로 추밀원 의장 이토가 사망하자 정부 대표로 청국 다롄(大連)에 가서 순종과 고종이 조문칙사로 보낸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 승녕부(承寧府) 총관 조민희(趙民熙) 등과 함께 조문. 11월 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이토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대한제국 정부•내각과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 주최로 관민추도회(官民追悼會)를 열고 내각 대신들을 대표해 ‘고 태자태사 대훈위 문충공 공작 이등박문 전하’에게 올리는 조사를 낭독. 같은 달 이토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표창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동아찬영회(東亞讚英會) 총회에서 총재로 추대됨.
- 이토 사망 후 내각 조문대표로 일본에 가 있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시켜 일본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을 탐문케 했고, 일진회(一進會)가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자 1909년 11월 탁지부 대신 고영희를 오사카(大阪)의 조폐국 화폐시찰 명목으로 일본에 보내 수상 가쓰라 타로(桂太郞)에게 ‘합방안 5개 조항’을 제출케 했으나 거절당함. 12월에 일진회가 ‘합방청원서’를 발표하자 이를 저지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측근인 이인직(李人稙)을 시켜 원로 정치인과 반(反)일진회 세력을 규합해 국민연설회(國民演說會)를 열게 하는 한편 일진회가 황제와 내각에 보낸 상주문과 의견서를 돌려보냄. 같은 달 22일 동현[구리개] 천주교 성당에서 벨기에 총영사 주최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다가 이재명(李在明)의 칼에 찔려 왼쪽 폐를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음.
- 1910년 7월 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합병조약’ 체결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 지음. 8월 22일 창덕궁에서 열린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조약 체결 전권을 위임받아 조중응과 함께 통감 데라우치 관저에서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여한다’는 조약에 서명.
이 ‘합병조약’을 주도함으로써 황족대표로 참석한 이재면(李載冕) 및 박제순(내부대신), 조중응(농상공부대신), 고영희, 민병석(閔丙奭 : 궁내부대신), 윤덕영(尹德榮 : 시종원경), 이병무(시종무관장 겸 친위부 장관)와 함께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음. 같은 해 10월 총독부가 주는 퇴직금 1458원을 수령.
-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연수당 1600원을 받음.
- 1912년 8월부터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어 1926년 2월 사망할 때까지 14년여 동안 연임하면서 매년 2000원에서 3500원의 수당을 받음. 1910년 10월 7일에는 「조선귀족령」에 따라 백작 작위를 받음. 같은 해 12월 조선 귀족의 실업(實業)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명농회(明農會) 조직에 참여해 취지서와 규칙을 발간.
- 1911년 1월 은사공채 15만 원을 받았고, 2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봉수식(爵記本書捧受式)에 의복을 갖추어 참석. 같은 해 9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 창립총회에서 백작 이사, 1918년 5월에는 부회장에 선출. 1925년 4월에는 임기가 만료된 조선귀족회 대표이사에 재 선출. 조선귀족회는 작위를 받은 조선귀족들이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
- 1911년 10월 천황 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행사에 조선 귀족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1912년 3월에 조선귀족심사위원에 임명. 7월 경기도에서 농지 50정보(町步)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 결성된 농사장려회 회장에 선출.
같은 달 천황 메이지의 병 문안차 조선 귀족 대표로 도쿄에 갔다가 메이지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두 달 동안 머물다 귀국.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2월에 종3위에 서위됨.
- 1913년 1월 조선귀족회 총회에 참석해 ① 국어(일본어)보급을 위해 유치원 창설, ② 귀족 자제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행(素行)이 향상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의도덕을 갖춘 유용한 재기(才器)로 양성, ③ 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고, 이를 위해 지방 소유 전토(田土)를 시찰하는 동시에 농업의 개량 장려를 주장하여 외지 농민에게 모범을 보일 것 등 3개 항을 의결. 같은 해 4월 메이지에 이어 등극한 다이쇼(大正)를 문안하기 위해 조선 귀족 대표로 도쿄를 방문, 7월 메이지의 1주기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도쿄를 방문. 이때부터 생일도 음력 6월 7일에서 양력 7월 17일로 바꿈. 같은 해 7월 조선 귀족들의 식림사업•농장경영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임업조합 보식원[朝鮮林業組合普殖(植)園] 창립총회에서 간사에 선출. 그해 10월 천황 다이쇼가 이완용의 필법을 직접 보기 위해 휘호를 써 보내라는 전갈과 함께 비단 한 필을 보내자, 그날로 ‘해저를 벗어나지 못하니 온 세상이 어두웠는데, 천중(천황)에 이르니 만국이 밝아지도다(未離海底千山暗 及到天中萬國明)’라는 시를 그 비단에 써서 일본 궁내성에 바침.
- 1914년 9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부 평의원에 임명. 1915년 1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기념 조선물 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해 상의원에 선출. 4월 명예회원으로 기부금을 냄. 1915년 8월 가정박람회 명예고문, 10월 조선총독부가 농업지도와 농민지배를 목적으로 후원해 조직한 조선농회의 회두(會頭)에 선임.
- 1915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천황 다이쇼 즉위 대례식에 참석하고 처 조씨(趙氏)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16년 6월 총독 데라우치의 일본 내각 총리대신 영전을 축하하고 후임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에 감. 같은 해 7월 조선인 문사(文士)와 일본인 문사들의 친목단체인 이문회(以文會)의 회두에 선출. 9월 조선반도사 편찬 및 조선인명휘고 편찬 심사위원으로 활동. 반도사 편찬은 조선사 편찬으로 이어졌고,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고문에 임명된 데 이어, 1925년 7월에는 조선사편수회 고문에 임명. 1917년 10월 ‘조선불교를 옹호하고 더욱더 신앙적 수양을 쌓아 소질권면(素質勸勉)의 풍(風)을 흥(興)하고 충량한 신민을 기(期)’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불교옹호회의 평의원장에 선출. 1918년 4월 정3위로 승서되었고, 7월에 조선국세(國勢)조사평의회 평의원에 임명. 같은 해 11월 서화예술의 진흥 및 서화취미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서화협회의 고문에 추대.
- 1919년 1월 고종의 국장(國葬) 때 어장주감제조(御葬主監提調) 및 국장 고문과 장의괘(葬儀掛) 차장에 임명되어 장의를 주관, 고종의 생전 일대기를 기록한 행장과 덕행을 칭송하는 시책문을 직접 작성. 같은 해 6월 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 고종 국장 이후 3•1운동이 격화되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세차례나 ‘경고문’을 발표. 4월 5일자 「적의(適宜)의 경고」라는 제목의 제1차 ‘경고문’에 서, 조선독립이라는 선동이 허설(虛說)이며 망동(妄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각 지방에서 이를 듣고 뒤따라 치안을 방해하니 당국에서 즉시에 엄중 진압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근일 듣자하니 모모 처에서 다수 인민이 사상(死傷)하였다 하니 그 중에는 주창한 자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뒤따른 자일 것으로 자신한다. 남을 따라 망동하면 다치거나 죽음이 앞에 있을 것이니 이야말로 살아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안심 진정함이 일시라도 늦으면 그만큼 해가 될 것이니 오호 동포여 내말을 잘 듣고 후회하지 말라. 나의 이런 권고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의견 나누기를 바란다고 경고. 4월 9일자 「이백(李伯) 재차 경고」에서는 본인이 동포 제군에게 경고한 목적은 단순히 인민의 사상을 없게 하고자 함이다. 근일 각 신문지상으로 제군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각처의 언론이 더욱 엄중하니 본인도 조선인이라 책임상으로나 인정상으로나 그 위험이 목전에 다가와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매국적(賣國賊)의 경고라 하여 자신의 안위에
까지 유관한 일을 듣지 않음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지성이면 하늘도 감한다니 제군이 감하기까지 위협을 불원하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는 호소조의 제2차 ‘경고문’을 발표. 5월 30일자에는 「이백 삼차 경고」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발표해 본인이 다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설이 허망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여 우리 조선민족의 장래 행복을 기도함에 있다. …… 오늘날 구주대전(歐洲大戰)으로 인해 전세계를 개조하려는 시대에 우리가 이 삼천리에 불과한 강토와 모든 정도가 부족한 천여백만의 인구로 독립을 고창함이 어찌 허망타 아니하리요 라면서 조선독립의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병합 이래 근 10년 동안 총독정치의 성적을 보건대 인민이 누린 복지가 막대함은 내외국이 공인하는 바이다. …… 지방자치•참정권•집회와 언론 문제 등은 제군의 생활과 지식 정도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한다면 동정도 가히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가장 급한 것은 실력양성이다고 결론을 내림. 1919년 8월 자작 조중응이 사망하자 매일신보 8월 29일자에 「진취적 기상에 장한 동양민족주의자 ‒‒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내선융화에 진력하여」라는 글을 실어 조선•일본•중국을 아우르는 ‘동양민족주의’를 주장한 조중응의 뜻을 이어 내선융화에 힘쓸 것을 주장.
- 이에 앞서 왕세자 이은(李垠)의 결혼식이 확정되자 매일신보 1916년 8월 4일자에 「일선영구(日鮮永久)의 친의(親誼) ‒‒ 무상(無上)의 경사」를 발표해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통혼(通婚)’을 통해 내선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 1920년 4월 도쿄의 왕세자 이은과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왕세자비 李方子)의 결혼식에 조선 귀족을 대표해 참석. 같은 해 12월에 후작으로 특별히 승작(陞爵)되는 한편 임시교육조사위원에 임명. 매일신보 1920년 12월 29일자 「우악(優渥)한 성지(聖旨)에 감읍」에서, “천은의 감격하옵심을 깊이 느껴 폐하의 성지의 만일(萬一)에 봉답코자 익익 노력코자 하며, 금후 내선(內鮮) 공존공영의 실(實)을 거하여 선제(先帝) 폐하와 이태왕 전하께서의 일한병합의 본지를 진(盡)하며, 겸하여 동양평화를 보지(保持)함은 물론 내선 양족(兩族)으로 합성된 대일본제국 국위가 세계에 표양(表揚)됨을 깊이 축하하는 바이라”고 소감을 밝힘.
- 1921년 1월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고문에 추대. 대정친목회는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의 친목도모와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조직. 같은 해 8월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 같은 달 경성도시계획연구회 부회장에 선임, 1925년 8월에는 실행위원을 맡아 활동. 1922년 3월에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에 위촉되어 1925년 5월 제4회 때까지 매년 서예부문 주임을 맡음.
- 1924년 6월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내걸고 결성된 동민회(同民會)의 고문을 맡아 사망할 때까지 활동. 같은 해 7월 조선불교대회(朝鮮佛敎大會) 고문에 추대.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1920년 9월 설립된 조선불교대회가 1925년 5월 재단법인 조선불교단으로 바뀐 후에도 고문을 맡음. 조선불교단은 불교를 통한 조선교화사업을 위해 조직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불교에 대한 영향력 강화, 내선융화의 보조, 조선인의 사상 통제에 목적. 같은 해 10월 종2위로 승서.
- 1926년 사망. 사망 다음 날 특지(特旨)로 정2위로 추서되면서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을 받음. 같은 달 16일 유언에 따라 아들 이항구가 사회사업 기부금으로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3만 원을 전달. 1925년 당시 이완용의 재산은 300만 원으로 조선귀족 가운데 6000만 원을 소유한 민영휘(閔泳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1935년 2월 경성부 공회당에서 이완용 사망 10주년을 기리는 추도회가 열림. 1939년 11월 일본의 대륙낭인단체 흑룡회(黑龍會)가 주최한 ‘일한합병’ 30주년 원훈 추도식에서 이용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박영효(朴泳孝) 등과 함께 합병공로자로 선정됨.
- 제공자 경기도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24-04-30
- 지역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