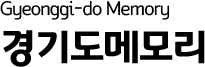박제순(朴齊純)
출생일: 1858.12.07
사망일: 1916.06.20
행위분야: 중추원
인물경력
- 1883년 4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를 시작으로 10월 톈진(天津)주차 서기관, 1884년 1월 기연해방군사마(畿沿海防軍司馬), 3월 톈진주차독리통상사무(天津駐箚督理通商事務) 종사관에 임명. 1885년 3월 홍문관 부교리, 5월 사헌부 장령, 1886년 1월 주진대원(駐[天]津大員), 2월 주진독리통상사무를 거친 후 4월에 귀국하여 7월에 승지로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톈진에 부임하여 1887년 6월까지 근무. 귀국한 다음 달인 7월부터 11월까지 이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참의내무부사, 경주부윤을 지냄. 1888년 5월 인천항 통상사무 감리, 1889년 3월 전환국 총판에 임명.
- 1890년 1월 내무부 협판으로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주재공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1890년 10월 형조참판, 12월 공조참판, 189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성부 좌•우윤과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1892년 7월 예조참판, 1893년 7월 이조참판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침.
- 1893년 8월 여주목사, 1894년 4월부터 7월까지 장흥부사, 전라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 등 지방관 역임. 충청도관찰사 재직 중 일본군과 연합해 충청남도 공주에서 동 학농민군 진압작전에 참여. 당시 불린 “새야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박으로 너를 치자”라는 가사 중 박이 박제순을 일컬을 정도로 농민군 진압에 큰 ‘공’을 세움.
- 1895년 10월 제용원 태복사장(濟用院太僕司長), 11월 외부협판, 1896년 2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
- 1898년 8월 외부협판으로서 외부대신 서리를 맡았다가 10월에 외부대신으로, 11월에는 농상공부대신으로 전임했으며, 5일 만에 외부대신으로 복귀하여 1905년 9월까지 여러 차례 외부대신을 역임.
- 1899년 1월 청국의약전권대신(淸國議約全權大臣)에 임명되어 한청통상조약, 간도행정관리권 교섭, 경흥•의주 개방 등을 단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같은 해 10월 외부대신으로 비서원경•장례원 장례를 겸했으며, 1900년 1월 법규교정소 의정관을, 12월 형법교정 총재를 겸하는 한편, 육군 참장에 임명.
- 1899년 6월 궁내부철도용달회사 사장을, 1900년 3월 직조학교(織組學校) 교장.
- 1900년 3월에 러시아의 압력 아래 마산포에 있는 각국 거류지 밖 10리 이내 지점을 조차한다는 내용의 거제도협약(巨濟島協約)을 맺고, 1901년 3월에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4월에는 일본과 소총 및 탄약 매입계약 등을 체결.
- 1901년 8월 만한교환설(滿韓交換說)이 대두되자 망명자의 송환과 해외추방을 전제로 한일제휴를 상주(上奏). 그해 10월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고, 11월 특명전권공사를 겸임하면서 일본육군 대연습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만한교환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향을 탐지하고 한일동맹•망명자 문제•재정 원조 등을 타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일본에 체재하면서 일본국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음.
- 1902년 1월과 3월 주청(駐淸)전권공사에 임명된 후 일본에 이어 청국에 ‘삼국동맹’을 제안했으나 간도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의견 대립과 일본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음.
- 1904년 1월 귀국 후 외부대신에 임명되었고, 4월부터 11월까지 원수부 회계국 총장, 법부대신, 관제이정소(官制釐正所) 의정관 등을 역임.
- 1905년 3월 농상공부대신, 6월 학부대신, 7월에 다시 농상공부대신을 맡은 후, 일제의 강압으로 8월에 체결된 「한국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에 반대하면서 사직소를 올린 일로 9월 평안남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10일 후 다시 외부대신에 임명. 그해 10월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에 찬성금을 기부.
- 1908년 5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으로, 8월에 기호흥학회 찬무부 주무원(贊務部 主務員)으로, 12월에는 기호흥학회 특별찬성원으로 활동. 같은 해 6월 한중일 삼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글자를 수집•교정하여 자전(字典)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한자통일회(漢字統一會)의 발기인으로 취지서를 발표했고, 8월에는 교육진흥, 위생개선, 국민 자치 실현 등을 위한 관진방회(觀鎭坊會)의 회장을 맡음.
- 1909년 2월 학술연구•지식교환•환난상구•공제친목 등을 취지로 조직된 대동학우공제회(大東學友共濟會)의 찬성원을, 7월 한묵사(翰墨社)의 특별찬성장을 맡음.
- 1910년 12월 이완용•조중응 등과 함께 귀족의 가정정리(家政整理)를 종용(慫慂)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일반 가족의 가내수공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귀족은행(저축은행) 설립을 추진. 1911년 1월에는 이완용•조중응 등과 함께 각종 구관(舊慣)을 연구•조사하여 조선통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선구관연구회 조직도 추진.
- 1912년 1월 경학(經學)과 시문(詩文) 연구를 목적으로 이문회(以文會)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음.
- 1915년 8월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의 명예고문을 맡음.
친일행적
- 1905년 11월 외부대신으로 일제가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을 추진하자 참정대신 한규설과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권중현(權重顯 : 농상공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 학부대신), 이지용(李址鎔 : 내부대신)과 함께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음. 을사늑약 체결 직후 의정부 참정대신에 임명되어 형식적으로 친일내각의 수반이 됨.
- 1907년 1월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밝힌 고종의 친서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되자 대한자강회 등 계몽운동단체와 황성신문 등 언론이 내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박제순 등 을사오적에 대한 암살이 기도되자 5월에 사퇴했지만 곧바로 중추원 고문에 임명.
- 1907년 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여 조선인을 교화하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을 맡음.
- 1908년 9월 조선에 대한 자선구제와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진출한 동양협회(東洋協會) 사업에 찬성하여 100원을 기부. 10월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이 됨. 동양협회는 1907년 2월 조선과 타이완(臺灣)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조직
- 1909년 2월 송병준(宋秉畯)에 이어 내부대신을 맡았고, 12월 이완용이 이재명(李在明)의 거사로 중상을 입자 임시서리 내각총리대신에 임명.
-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官民追悼會)를 발의하여 추모하는 한편, 이토를 기념하는 송덕비를 건립하기 위한 송덕비건의소(頌德碑建議所) 찬성원을 맡음. 1910년 4월 ‘합일합병’ 추진 단체인 정우회(政友會)를 후원하기 위해 금화(金貨) 200환을 기부.
- 1910년 6월 총리대신 서리로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내용의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는 내부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가결에 동조함으로써 이재면(李載冕 : 황실대표), 이완용(총리대신), 조중응(趙重應 : 농상공부대신), 고영희(高永喜 : 탁지부대신), 민병석(閔丙奭 : 궁내부대신), 윤덕영(尹德榮 : 시종원경), 이병무(李秉武 :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등과 함께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음.
-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6년 6월 사망할 때까지 6년여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음. 10월 7일에는 「조선귀족령」에 따라 자작 작위를 받았고,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하여 일본 천황에게 사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귀족일본관광단’의 일행으로 시모노세키(下關)•나고야(名古屋)•도쿄•하코네(箱根)•닛코(日光)•교토(京都) 등을 방문했으며,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연회에 초대받아 천황이 주는 주병(酒甁)을 받음.
- 귀국 후 매일신보 1910년 11월 18일자에 “금후 일선(日鮮) 양민간의 친화는 오래지 않아서 이룰 것이오 수년을 지나지 않아 일선(日鮮)이 일단(一團)이 될 것은 우리들이 확신하는 바로다. …… 예성문무(叡聖文武)하옵신 천황 폐하로부터 박애인자한 내지 동포의 지도에 의해 장족의 발전을 계(計)하여 성상의 홍덕(洪德)에 목욕하기를절망(切望)할 뿐”이라는 소감을 밝힘.
-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 원을 받았고, 2월에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봉수식(爵記本書捧受式)에 의복을 갖추어 참석. 같은 해 7월부터 경학원 대제학에 임명되어 1916년 6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실(實)을 행하지 않고 허식만을 존중하는 말류의 폐단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서 충효의 강조 등 유교의 진흥을 주장함으로써 식민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 경학원은 조선총독부가 성균관의 기능을 식민지배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직속기구.
- 19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완용•조중응과 함께 조선 귀족 대표로 도쿄에서 열린 천장절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옴.
-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2월 정4위에 서위.
- 1915년 1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에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
-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 대례식에 조선 귀족으로 참석하여 “직접 거룩한 시대를 만나 성대한 의식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바, 하늘을 바라보고 성인을 우러르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립니다.”라는 「즉위 대례식 헌송문(卽位大禮式獻頌文)」(경학원잡지 1915년 12월호)을 지어 바쳤고, 처 서씨(徐氏)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음. 1916년 특지(特旨)로 종3위에 추서.
- 제공자 경기도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24-04-30
- 지역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