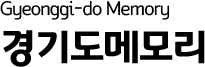이인직(李人稙)
출생일: 1862.07.27
사망일: 1916.11.25
행위분야: 기타
인물경력
- 1896년 조중응(趙重應)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해 이후 도쿄(東京)정치학교에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1900년 2월 관비유학생으로 정식 입학해 1903년 7월 졸업. 재학 시절 고마츠 미도리(小松綠)에게 배움.
- 1898년 10월에 개교한 도쿄정치학교는 신문기자•정치가•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 위주로 교육했으며, 특히 신문기자의 양성에 힘을 쏟음. 이러한 학교 방침에 따라 1901년 11월 미야코신문(都新聞)의 견습생으로 들어감.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몽중방어(夢中放語)」, 「조선문학 과부의 꿈」(朝鮮文學寡婦の夢), 「조선인의 신년 축하」(朝鮮人の新年の祝賀), 「설중참사(雪中慘事)」, 「잡보 한국잡감(雜報韓國雜感)」, 「한국실업론(韓國實業論)」 등을 연이어 게재.
- 귀국 후, 1903년 5월 신문을 창립코자 한다는 뜻의 「한국신문창립취지서」 발표.
- 1906년 6월 손병희•오세창 등이 일진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의 주필을 맡음.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혈의 누를, 1906년 10월부터 1907년 5월까지 귀의 성을 연재.
- 1908년 대한학회 찬성회 발기인으로 참여.
- 1908년 3월 이완용 내각의 중추원 부찬의로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신병상의 이유로 사직. 같은 해 7월 원각사가 개장되자 연극 개량을 목적으로 일본 시찰 길에 올랐고, 이때부터 원각사 대표를 맡음. 9월 치악산 상편을 유일서관(唯一書館)에서 발간, 11월 신극 대본 은세계를 동문사에서 발간.
- 1909년 10월 대동학회를 계승한 공자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
- 1912년 3월 1일자 매일신보에 단편소설 「빈선랑(貧鮮郞)과 일미인(日美人)」을 발표, 1913년 2월부터 6월까지 모란봉(牧丹峰)을 연재하다가 중단.
친일행적
- 1904년 2월 일본 육군성 제1군사령부 소속 판임대우 통역으로 임명되어 러일전쟁에 종군했다가 같은 해 6월 통역에서 해임. 공훈심사에서 공로갑(功勞甲)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08년 2월 하사금을 받음. 1905년 동아청년회에 가입.
- 1906년 2월 일진회(一進會) 기관지 국민신보의 주필을 맡음.
- 1907년 7월 만세보가 재정적 이유로 폐간되고 친일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 대한 신문으로 바뀐 뒤 대한신문사 사장에 취임. 이후 이완용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의 비서 역할을 수행.
- 1909년 11월 7일 경성의 한자신문사(韓字新聞社) 주최로 거행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추도회에서 대한신문사 사장 자격으로 추도문을 낭독. 12월 이완용의 밀지를 받아 ‘합방’에 대한 정세 분석과 일진회의 ‘합방론’ 반대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 이완용 내각은 일진회 주도의 ‘합방’을 반대하기 위해 조중응•김학진•이인직 등이 주간하는 공자교회를 내세워 전국에 사람을 파견해 유림을 선동. 1910년 1월 공자교를 유학생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지회 사무소를 일본에 설치했으며, 6월에는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를 환영하기 위해 공자교회 대표로 일본에 감.
- 1910년 8월 고마츠를 찾아가 ‘한일합방’을 비밀리에 교섭. 이에 대해 고마츠는 훗날의 회고에서 “내가 병합문제를 담판 짓는 기회를 붙잡을 자신이 있다고 데라우치 통감에게 말했던 것은 터무니없는 한때의 농담이 아니었다. 실은 당시 한국 조정의 중심 세력이던 수상 이완용과 농상 조중응을 직접 간접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중응과는 직접 말할 수 있었지만 이완용은 일본말을 몰라서 그의 심복인 이인직을 통해 복안을 말할 작정이었다.”라고 밝힘. 이인직과 고마츠의 교섭을 토대로 1910년 8월 16일부터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 합병조약 체결 교섭이 시작되었고, 8월 22일 정식으로 조인. 같은 해 9월 경무총감부에 체포 후 풀려남.
- 강제병합 후, 1911년 7월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의 사성(司成)에 임명되어 연수당 900원으로 고등관 수준의 대우를 받음.
- 1913년 5월 경상남북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지에 출장해 유림의 정황을 시찰. 같은 해 11월 경학원이 전라북도 강사의 순회강연을 시찰할 때, 금산군에서 조선왕조의 통치를 비판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강연. 같은 해 12월 경학원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편찬주임을 맡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발행.
- 1914년 4월 경학원 시찰단의 일원으로 다이쇼(大正)박람회 관람을 위해 일본에 감. 같은 해 8월 함경북도 등을 시찰할 때 지방 인사들과 회동하여 강화(講話)를 했는데, 총독 데라우치의 조선합병을 칭송하고 일제의 무단통치를 덕치(德治)에 비유하면서 모든 분야가 발전하는 은택을 입었다고 식민통치를 미화.
- 1915년 11월 경학원의 간부와 강사 18명이 다이쇼천황의 ‘즉위대례식 헌송문(卽位大禮式獻頌文)’을 지어 조선총독부에 헌상하고 12월 경학원잡지 제9호에 이를 게재. 축원문에서 이인직은 일계(一系)의 황통(皇統)을 찬양하고 천황의 덕성을 칭송하면서 즉위를 진하(進賀)하는 충정을 밝힘.
- 1915년 11월 함경남도 등지를 시찰할 때 이원군(利原郡)에서 ‘선인 절대적 복리가 동화에 재(在)’라는 제목으로 강연. 이 강연에서 “여(余)가 수년래(數年來)에 조선인 전도(前途)의 복리(福利)를 기도하는 파심(婆心)으로 연구에 연구를 가(加)한즉 선인절대적복리(鮮人絶對的福利)가 동화(同化)에 재(在)한 줄을 맹성(猛醒)한지라”고 하며 조선인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골수가 대화혼(大和魂)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1916년 11월 쇼와(昭和) 황태자 즉위식이 거행되자 경학원 간부와 강사 19명은 입태자례헌송문(立太子禮獻頌文)을 지어 조선총독부에 헌상. 이 글들은 12월 경학원잡지 제12호에 게재되었는데, 이인직은 천황의 통치를 태평성세에 비유하고 모두가 성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다고 송축.
- 제공자 경기도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24-04-30
- 지역 이천
- 파일명 210060490_IT0050195_20240418_DU_001.png
- 파일 형식 png
- 파일 크기 0.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