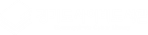술과 삶 속 이야기
- 술 익는 마을의 추억담양평군 지평면 김문경
- 막걸리 한잔과 모내기 풍경양평군 지평면 이동선
- 막걸리에 바친 청춘포천시 이동면 임북실
- 가장 작은 양조장 이야기포천시 양북면 전기보
- 벗들과 마실 술 담는 부부고양시 전신영, 이기풍
- 술향기와 함께 자란 아이고양시 덕양구 박상빈
- 한 가족의 희노애락양평군 지평면 정환진
 술과 함께 삶을 빚어가는 사람들
책자 바로보기 →
술과 함께 삶을 빚어가는 사람들
책자 바로보기 →
막걸리에 바친 청춘
“막걸리 징글징글 하지… 하지만 그걸 사랑해야지 어떡하니, 내 밥벌이인데…
한 때는 멀리 갈 맘도 있었어. 근데 애들 때문에 살아지고, 살고 보니 또 희망이 있더라고…”
막걸리에 바친 청춘
막걸리는 맛있다. 갓 빚은 막걸리도, 며칠간 지긋하게 숙성된 막걸리도 맛있다. 이 막걸리는 유독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 비 오는 날, 들기름 냄새 고소한 도토리묵,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들려주는 주인장의 옛 이야기… 포천시 이동면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 공간이 안주고 주인장이 양념이 되는, 오래되고 소박하지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최후의 대폿집 같은 곳이 말이다. “내 나이 칠십 아홉, 이름은 임북실이, 고향은 강원도 주문진이야. 남편을 따라 포천에 들어 왔어. 옛날에 애들 아버지가 주문진에서 군대생활을 할 적에 나한테 연애를 걸어가지고… 그러다 결혼을 하고, 결혼했으니 따라서 와야지. 애들 아버지 고향이 포천이었어… 그때만 해도 연애… 뭐 별거 아니야. 몇 번 만나고, 다방에 가서 차나 마시고,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포천에 스물다섯 살에 왔을기야. 결혼은 주문진에서 하고 여길 왔지.” 포천에 들어온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막걸리 직매장을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며 그녀의 막걸리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막걸리직매장을 내가 스물여섯 살 때부터 했으니까, 시방 칠십 아홉이거든, 그러니까 54년째 이걸 하고 있지. 왜 시작하긴, 그때는 할 게 없었으니까. 또 집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으니 우리 애들 아버지가 ‘막걸리를 팔면 되겠다’ 해서… 공장에서 직매장을 차려 준거지, 그때 양조장하고 사이가 좋았어. 사람들이 착했어.” 그녀에게는 딸 둘, 아들 둘이 있다. 이 한자리에서 막걸리를 팔아 키우고 가르쳐 시집 장가를 보냈다. “그러느라 청춘을 막걸리에 바쳤지… 인생살이 막걸리로 다 끝난 거야.” 54년 전, 차도 흔하지 않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의 막걸리를 파는 풍경은 어떠했을까. “공장서 막걸리를 지게로, 물지게 있지, 그거로 날았어. 나중에는 공장에서 차로 배달을 해줬지만 처음엔 내가 다 날랐어. 그땐 냉장고가 없지, 그래서 땅을 파고 독을 두 개 묻어. 시원한 땅이고 머고 그냥 파서 독을 묻어 놓으면 그게 땅으로 들어가니 시원하지… 항아리가 컸지, 항아리 하나는 서 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두어 말 들어가고… 그래서 양쪽에 닷말 들어갔지 그 항아리를 채우려면 물지게로 막걸리를 다섯 번은 날라야 했어… 매일은 아니고, 술이 잘 나가면 내일 또 가지고 오지만 술이 안 나가면 못 나르지….” 그녀의 남편은 한량이었다 한다. 젊고 곱던 그녀가 막걸리를 나를 때 한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런 걸 안 해. 전혀 안 해… 내가 다했어.” 말끝에 그녀의 막걸리 잔이 비워진다.

막걸리로 맺어진 인연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그녀가 술잔에 막걸리를 콸콸 따르다. 잔에 그득하게 막걸리를 받아 마시니 훈훈함과 취기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운다. “인생 얘기하면 끝도 없지, 행복이란 게 없었어. 애들 아버지가 내가 마흔 둘인가 셋일 때 돌아가셨어. 그때 애들이 어렸어. 근데 그때부터 여기(백운계곡)가 관광지가 되면서 술이 좀 많이 나갔지. 그래서 막걸리 팔아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시집 장가도 보내며 지지고 볶고 살아 온거야. 나는 아주 막걸리라면 징글징글해. 그래도 막걸리는 맛있지.” 오가던 술잔에 흘러간 할머니의 인생이 너울대며 그려진다. 그리웠던 시간들, 가슴 아팠던 세월들이었다. “막걸리 팔며 힘든 일 많았지. 옛날에는 막걸리가 구역제기 때문에, 술이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 걸리면 벌금이 나와. 누가 서울이나 이런데 가지고 가면, 이게 세무서 걸렸다 하면 벌금을 때려. 그래가지고 언젠가 의정부 세무서에 걸린 거야. 찾아가서 울며불며 사정사정 하니 혼자서 애 키우며 살고 이러니까 봐 주더라고… 그런 적도 있지… 사는 게 참 힘들었지.” 그녀의 술잔도,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모두 아리다. 젊은 시절. 눈물바람이 마를 날이 없었으리라. “술 먹고 많이 울었지… 그래서 술이 내 친구야…….” 옛날 이곳은 군인들 세상이었다. 손님들 대부분도 군인이었고. 그들 때문에 생긴 재미난 일도 많았다. 지금도 지난 시절 막걸리를 같이 나누던 군인 친구들이 주정을 나누던 막걸리 친구가 그리워 백발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는다. “오래 전이어도 보면 기억이 나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할망구~”라고 부르지. 군인들하고 친했으니까, 옛날엔 오해한 군인 마누라도 많았어. 그런데 난 동네서 그렇지 않다는 거 인정을 하니까 오해가 풀리긴 했지. 그래도 혼자 살면 의심도 많아. 힘들었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가 고왔거든.”

내가 죽을 자리는 포천, 이곳이 이제 내 고향
그녀의 고향은 바다가 있는 주문진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포천에 살다보면 고향이, 바다가 그립진 않을까. “친정은 일 년에 한 번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빠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포천이 고향이지. 사실 포천은 좀 막막할 때가 많아. 시방 내가 나이가 있고, 정이 붙어 사는 거지 젊으면 쓸쓸해서 못살아.”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켜 떠나보내고 정든 이곳이 좋아 아직도 홀로 가게를 지킨다. “애들이 나 술 못 먹게 안 해. 내가 술을 먹으면 ‘몸을 생각해 조금 먹으라’ 하지. 근데 내가 막 뭐라 했어 “내 벌어 내 먹는데, 내 죽든 살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나니 내가 술을 먹던 말던 아무 말 안 해. 이제 또 살만큼 살았는데 뭘.” 일흔 아홉, 고단한 나이지만. 그녀는 365일 아침 여섯시면 가게 문을 연다. “쉬질 않아. 당연히 힘들지, 쉬려면 사람 둬야 하는데 하루 일당이 6만 원이야. 그럴 바엔 그 돈으로 술 먹는 게 낫지….” 술 조금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여기 이 가게를 하시면 안 되겠느냐 여쭈니. “술이란 고만이 없어. 먹을 만큼 먹어야지… 맛있잖아 술… 막걸리와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도 즐거워. 힘은 들지만, 징글징글도 하지만, 그걸 사랑해야지 어떡하니. 내 밥벌이인데… 한 때는 멀리 갈 맘도 있었어. 애들 때문에 살고… 살고 보니 또 희망이 있더라고….” 지나는 이 없을 것 같은 한적한 시골길에 자리한 가게지만 꾸준하게 손님이 오간다. “여름에는 바빠. 그래서 딸이 와서 도와주잖아. 겨울엔 한가하지… 그래도 겨울이 좋아. 눈이 많이 오거든 눈이 막 쌓이면 여기(난로)다가 연탄 피워 돼지고기 구워서 술 한 잔 먹고. 나 오늘 술 일찍 먹는 거야. 시방 이래서(인터뷰)… 인자 고만하자, 술이나 먹고….”